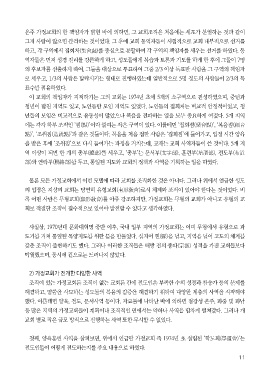Page 11 - 동로인 19년 1-3월호
P. 11
온주 가정교회의 한 책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 교회조직은 처음에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같이
그저 사람이 많으면 분리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교회 동역자들이 시험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선거를
하고, 각 구역에서 집회처(集會處)를 중심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의 책임자를 세우는 선거를 하였다. 동
역자들은 먼저 성경 진리를 강론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복습과 토론과 기도를 하게 한 후에 그들이 7명
의 후보자를 선출하게 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그중 2/3 이상 득표한 사람을 그 구역의 책임자
로 세우고, 1/3의 사람은 탈락시키는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2/3의 득
표수를 점유하였다.
이 교회의 책임자가 지적하기는 그의 교회는 1974년 초에 5개의 소구역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년과
청년이 합친 지역도 있고, 노인들만 모인 지역도 있었다. 노인들의 집회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청
년들의 모임은 비교적으로 유동성이 많았으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모두 중요하게 여겼다. 5개 지역
에는 각각 하부 조직인 ‘점(點)’이라 불리는 작은 구역이 있다. 이를테면 ‘집회점(聚會點)’, ‘복음점(福音
點)’, ‘조취점(造就點)’과 같은 것들이다.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은 ‘집회점’에 들어가고, 일정 시간 양육
을 받은 후에 ‘조취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교재는 교회 사역자들이 쓴 것이다. 5개 지
역 이상이 되면 한 개의 총부(總部)를 세우고, ‘총부’는 문서부(文字部), 훈련부(培訓部), 전도부(布道
部)와 연락부(聯絡部)를 두고, 통일된 지도와 교회의 정책과 사역을 기획하는 일을 하였다.
물론 모든 가정교회에서 이런 모델에 따라 교회를 조직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성도
의 입장은 지상의 교회는 당연히 유형교회(有形敎會)로서 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
록 어떤 사람은 무형교회(無形敎會)를 아주 강조하지만, 가정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아니고 유형의 교
회로 적절한 조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상, 1970년대 문화대혁명 중반 이후, 국내 일부 지역의 가정교회는 이미 무형에서 유형으로 과
도기를 거쳐 통일된 목양지도를 위한 틀을 만들었다. 심지어 현(縣)을 넘고, 지역을 넘어 고도의 체계를
갖춘 조직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은 해방 전의 종파(宗派) 성격을 가진 교회들보다
탁월했으며, 동시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2) 가정교회가 전개한 다양한 사역
조직이 있는 가정교회든 조직이 없는 교회든 간에 전도인은 부족한 수의 성경과 찬송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복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역을 시작해야
했다. 이를테면 양육, 전도, 문서사역 등이다. 자료들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절강성 온주, 화중 및 화남
등 많은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계획이나 조직적인 면에서는 약하나 사역을 힘차게 펼쳐갔다. 그러나 개
교회 별로 작은 규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역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첫째, 양육훈련 사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가정교회 즉 1974년 초 설립된 ‘학도회(學道會)’는
전도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11